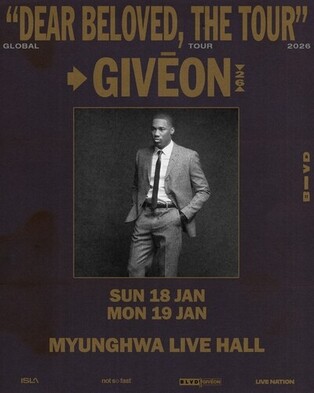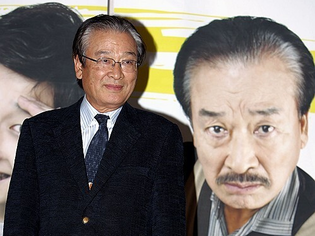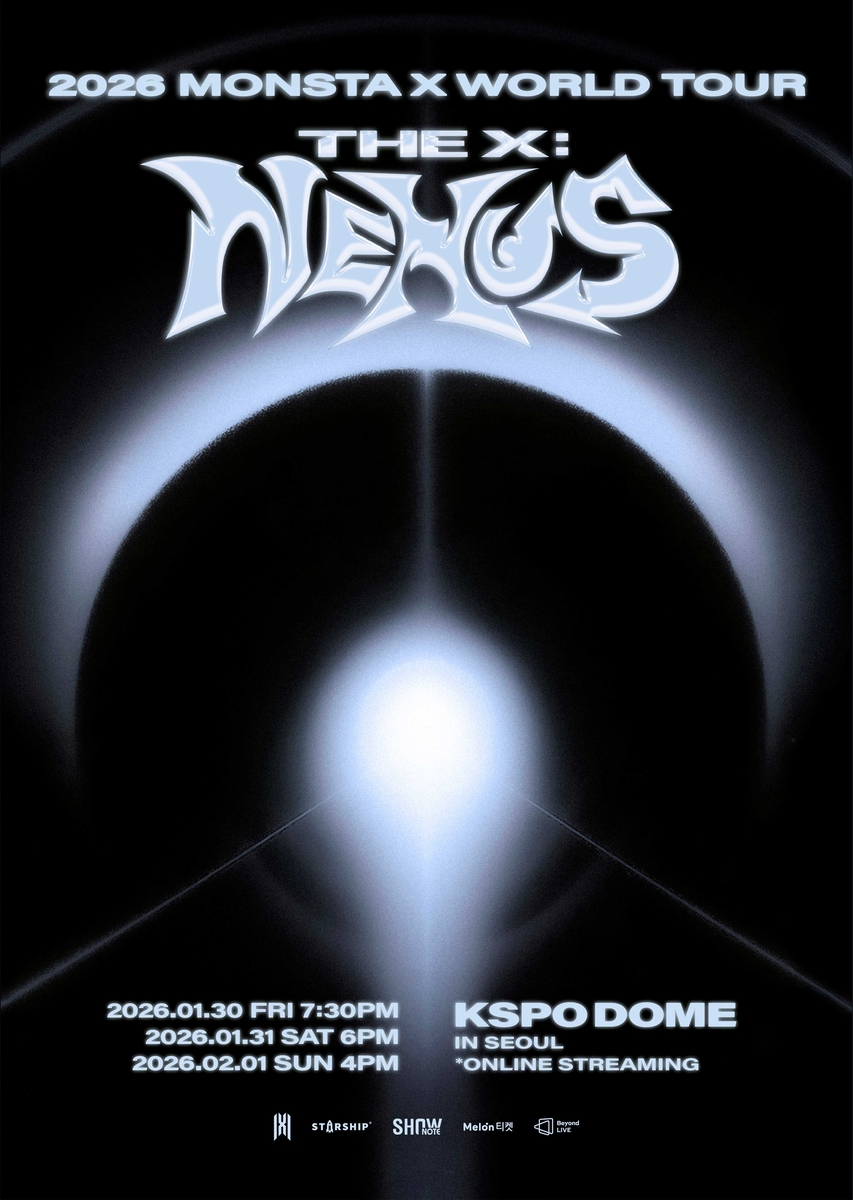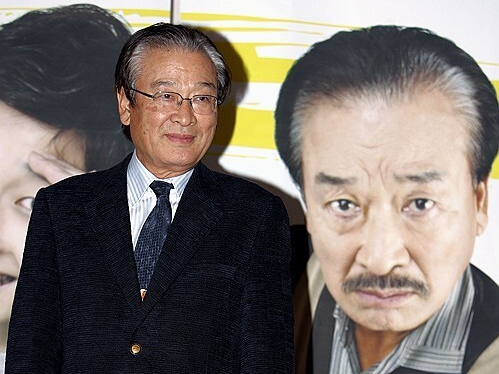국립박물관 학예사가 이야기하는 '큐레이터'와 '옛 지도'
'한번쯤 큐레이터'·'알고 보면 반할 지도' 출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해 연구·전시하는 국립박물관 학예사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쓴 책이 잇달아 출간됐다.
미술사를 전공한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박물관 학예사의 일상을 담담한 필치로 기록한 '한번쯤 큐레이터'를 펴냈다. 19년차 학예사인 그는 '법당 밖으로 나온 큰 불화', '공재 윤두서',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같은 전시를 기획했다.
'큐레이터'는 학예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하지만 큐레이터라고 하면 왠지 미술관에서 일하는 우아한 분위기의 전문가가 떠오른다.
저자는 박물관 학예사가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놓는다. 오히려 큐레이터는 평소 평범하게 생활하다가도 유물 앞에 서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부류라고 설명한다.
그는 박물관이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장소라는 시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이 극히 일부인 것처럼 큐레이터가 하는 일도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아 생기는 오해라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따금 수장고에 있는 유물이 여전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한글날을 앞두고 공개한 조선시대 초기 갑인자(甲寅字) 추정 금속활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관련 유물이 출토되기 전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입 큐레이터에게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부터 인수한 유물의 정보를 보완해 다시 등록하고 조사품을 분류하는 업무를 맡긴다면 자그마치 578년이나 걸린다고 말한다.
학예사가 알려주는 박물관 구경 잘하는 법도 있을까. 저자는 "애당초 박물관을 보는 정해진 규칙은 없다"며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나 의무 없이 그저 유물을 마주하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알고 보면 반할 지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리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옛 지도에 관해 쓴 글 20편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고지도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정작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여지도'를 제외하면 고지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옛사람들의 세계관이 오롯이 담긴 고지도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보물로 지정된 19세기 중반 '완산부지도'는 10폭 병풍으로, 마치 풍경화처럼 전주에 있던 건물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진산(鎭山·고을 뒤쪽에 있는 산)에 해당하는 산을 위쪽에 배치하다 보니 북쪽이 왼쪽을 향한 점도 특징이다.
저자는 이 지도에 대해 "건물과 성벽, 주변의 논밭과 하천, 그 땅을 따스하게 에워싼 산지의 모습이 어색함 없이 조화를 이룬다"며 "민가까지 세세하게 그려 넣은 화원(畵員)의 솜씨와 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가 보기에 조선시대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동람도'(東覽圖)는 민화나 투박한 막걸리 사발과 같은 지도다. 한반도를 둥글넓적하게 표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거의 직선으로 그렸다. 기재된 지명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가 의미가 없는 자료는 아니다. 저자는 "당시 사람들도 실제의 조선이 지도와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에 대다수의 옛사람은 이 지도를 보며 조선의 전체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번쯤 큐레이터 = 사회평론아카데미. 236쪽. 1만4천800원.
알고 보면 반할 지도 = 태학사. 192쪽. 1만6천 원.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