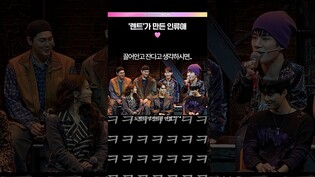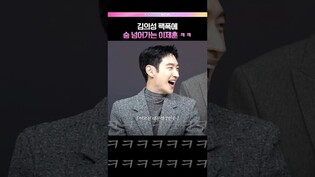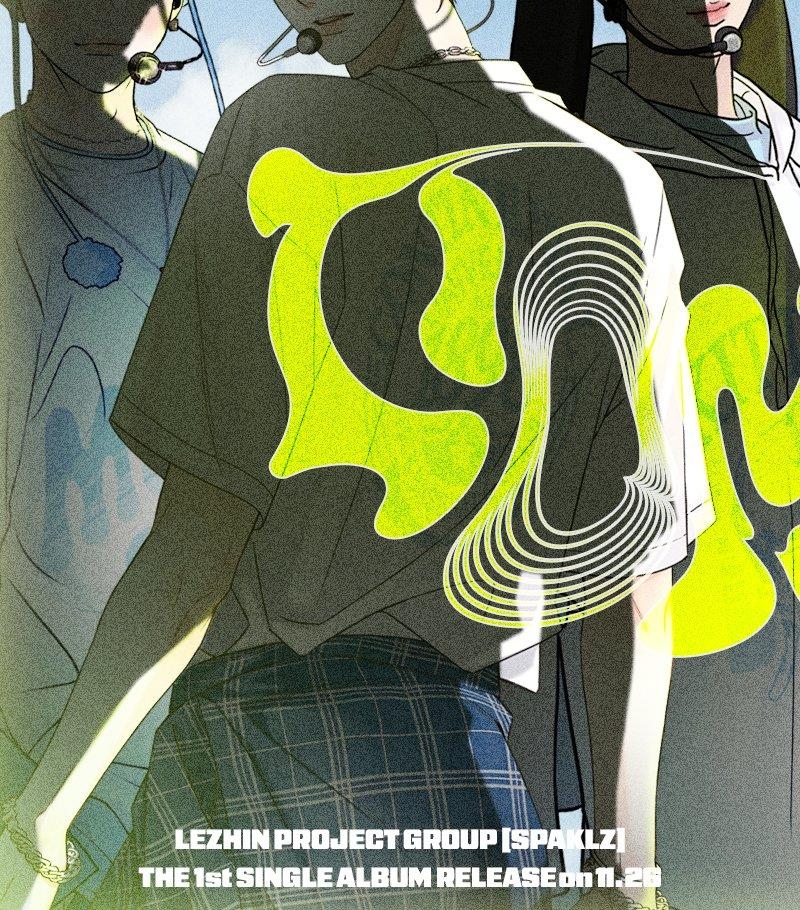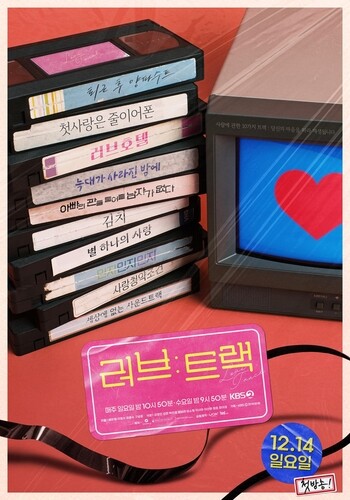|
| ▲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베를린슈타츠카펠레 [자료사진. ⓒJakob Tillmann/마스트미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
| ▲ [마스트미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브람스 교향곡을 생명체로 바꾼 베를린슈타츠카펠레
지휘자 틸레만 신뢰하며 악단 능력 극한으로 몰아붙여…최고의 브람스 선사
(서울=연합뉴스) 나성인 객원기자 = 창단 4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28일 롯데콘서트홀 공연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연주였다.
이 악단은 30년을 재직한 종신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함께 방한할 예정이지만 그의 건강상 이유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대신 지휘봉을 잡았다. 한때 틸레만 또한 몸이 편치 않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공연은 무사히 진행됐다.
지휘자의 스타일을 논하기 전에 이날 공연의 주인공은 단연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라는 악단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연 1부인 브람스 교향곡 2번 라장조의 1악장 시작부터 빈틈이 전혀 없이 꽉 찬 음향이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다. 단순히 기운찬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잘 '블렌딩'된 음향이었다.
저음역과 고음역, 직선적인 금관과 호른, 솔로로 나오는 목관과 받치는 현악 등 여러 음향 단위들이 균형을 이뤘고 합주 때에는 대단한 에너지를 쏟아냈다. 또 여린 대목에서는 매우 정감이 있었다. 단원 개개인의 능력과 예민한 청각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음악을 끌어가는 화성의 움직임이 매우 풍성히 드러나면서도 개개의 선율도 생생히 살아 있었다. 큰 붓으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음향을 그리고 그 속에 작은 붓으로 디테일한 선율을 새겨 넣은 것처럼 매 순간 완성도가 높았다.
악단의 이런 능력은 특히 2악장에서 두드러졌다. 두터운 화성의 움직임 안에서 선명히 솟아나는 선율이 더없이 세련되게 전달됐다. 3악장에서는 서정적 선율과 중간 부분의 역동적 움직임이 잘 대비고, 4악장은 '명불허전'이라 할만했다. 틸레만은 위험을 무릅쓰다시피 하며 다채로운 표현과 대비, 템포 상의 변화를 악단에 주문했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굉장한 템포와 다이내믹으로 악단을 몰아붙였다. 악단은 이를 더없이 훌륭하게 받아냈고, 관객들이 기립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결말을 만들어냈다.
이런 응집력 있는 연주는 공연 2부의 브람스 교향곡 1번 다단조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연주는 사실 어디까지가 바렌보임이고 어디부터가 틸레만일까를 사실상 구분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설정된 템포와 군더더기 없는 프레이징은 틸레만다웠지만, 악단의 폭넓은 다이내믹, 다채로운 색채, 오페라 악단다운 즉흥성 등에서는 바렌보임의 유산이 느껴졌다.
견고한 1악장, 악장 이지윤의 솔로 부분이 깊은 인상을 남긴 서정적인 2악장이 흐르는 동안 더블베이스 파트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한 음도 허투루 내지 않으면서도 놀랄 만큼 민첩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그저 저음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인의 발자국'을 들려주는 것처럼 선명하게 움직이며 홀을 진동시켰다.
틸레만은 이번 브람스 교향곡 1번 연주의 방점을 피날레에 뒀다. 특히 재현부에서는 같은 선율을 강하게 연주하여 변화와 고조를 끌어냈다. 금관의 강렬함은 점점 커져 악단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한 것처럼 클라이맥스에 강렬하게 금관의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이 대목은 4악장뿐 아니라 전곡의 정점이었다.
틸레만은 1번에서도 즉흥적이고 대담한 리듬 변화를 주문했고 특히 여러 연결구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많이 연출했다. 악기 그룹 간에 미묘한 어긋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음향 층은 이번에도 힘을 발휘했다. 덕분에 그런 어긋남이 오히려 음악을 신선하게 하는 묘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날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는 가장 뛰어난 사운드로 최고의 브람스를 선사했다. 지휘자를 신뢰하며 신선한 음향과 해석을 위해 악단의 능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 될 만했다.
이날의 브람스는 우수에 차고 묵직하고 중후하기만 한 고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이 없이 요동쳤다.
음악미학의 선구자 에두아르트 한슬리크의 말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형식',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았던 브람스였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