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중앙박물관서 11월까지 '등운산 고운사' 전시…영남 북부 불교문화 조명
도난됐다 돌아온 '아미타불회도' 공개…부석사·봉정사·축서사 괘불도
 |
| ▲ 영남 북부 불교문화의 정수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등운산(騰雲山) 고운사(孤雲寺)' 특별전에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성보인 봉정사(왼쪽)와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2022.8.25 utzza@yna.co.kr |
 |
| ▲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고운사 석가불좌상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등운산(騰雲山) 고운사(孤雲寺)' 특별전에서 관람객들이 조선 전기의 석가불좌상을 관람하고 있다. 2022.8.25 utzza@yna.co.kr |
 |
| ▲ 고운사로 돌아온 아미타불회도 최초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등운산(騰雲山) 고운사(孤雲寺)' 특별전에 최근 고운사로 돌아온 1701년작 아미타불회도(오른쪽)가 최초 공개되고 있다. 왼쪽은 사십이수관음보살도. 2022.8.25 utzza@yna.co.kr |
 |
| ▲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부석사 오불회 괘불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 로비에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보물)이 전시돼 있다. 2022.8.25 utzza@yna.co.kr |
고려 불교문화의 '꽃'…봉정사·봉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나란히
불교중앙박물관서 11월까지 '등운산 고운사' 전시…영남 북부 불교문화 조명
도난됐다 돌아온 '아미타불회도' 공개…부석사·봉정사·축서사 괘불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북 의성 등운산 자락에 자리한 고운사(孤雲寺)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관직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돌던 고운 최치원도 머무른 곳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다.
영남 북부 지역의 불교문화를 이끌어 온 고운사와 소속 말사인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등 주요 사찰의 귀중한 유물이 서울 나들이에 나선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와 소속 말사에 전하는 주요 유물을 모은 특별전 '등운산(謄雲山) 고운사(孤雲寺)'를 26일부터 연다고 25일 밝혔다.
박물관이 2018년 시작한 교구 본사 기획 전시 다섯 번째다.
전시는 고운사의 역사와 주요 성보(聖寶·성스러운 보물이라는 뜻)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붉은색 벽을 배경으로 한 석가불좌상이 관객을 마주한다.
고운사 나한전에 봉안된 이 불상은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추연 학예연구사는 "원래는 대웅전에 모셨을 것으로 보이나 화재로 대웅전이 타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가람 배치상 조금 밀려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 도난당했다가 재작년에 제자리로 돌아온 '아미타불회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고운사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교문화를 꽃피운 스님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소영 신경(미상∼1706) 스님은 고운사의 불사를 주관하며 여러 전각을 중수했다.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아미타불회도 등은 신경 스님과 문도들의 영향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영남 북부 지역의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도 한데 선보인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북부 지역은 흔히 유교 문화가 성행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불교문화 또한 꽃을 피운 지역이다. 고려시대 귀족적인 불교문화도 일부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유물이 안동 보광사와 봉정사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이다.
뛰어난 금속 세공기법이 돋보이는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고려 불교문화를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 유물이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보살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봉정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1199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국적인 풍모, 세련된 조각 기법과 균형미가 특징이다. 두 보살상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두 유물이 서울에 온 것도, 또 한자리에 모인 것도 모두 처음이라고 한다.
김 학예연구사는 "11∼12세기는 고려 시대에서 가장 귀족적인 성향이 강한 시기였는데, 남아있는 상이 많지 않다"며 "두 보물은 그간 자리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데 한 곳에서 다시 보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에서는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찰 건축물인 '연수전'(延壽殿)의 건립 과정이나 운영 현황 등을 기록한 자료도 소개한다.
특별전의 마지막은 1700년대 제작된 대형불화 '괘불'(掛佛)이 장식한다.
부석사, 봉정사, 봉화 축서사의 괘불 3점은 약 한 달 주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교차로 전시된다. 비슷한 시기 제작됐으나 형식이 다른 각 괘불을 비교해보는 것도 묘미다.
이번 전시는 보물 11건을 포함해 총 97건(231점)을 선보인다. 11월 27일까지.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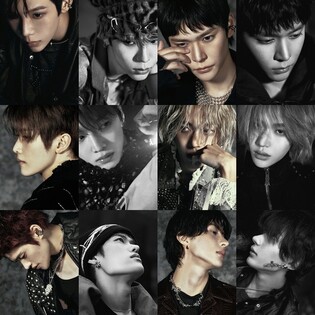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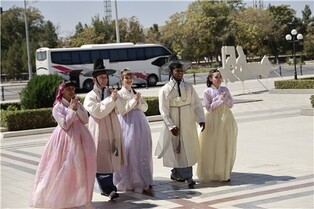







![[게시판] SM엔터테인먼트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 개최](https://korean-vibe.com/news/data/20251124/yna1065624915934913_179_thum.jpg)






